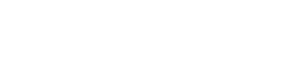목련(木蓮)은 ‘나무에 피는 연꽃’이다. 이른 봄,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 우리에게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탐스럽고 기품있는 꽃이다. 흰색, 분홍색, 연보라 등 꽃의 색상도 다양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백목련이다. 향기도 은은하고 청아하다.
목련과(Magnolia)에 속하는데 약 1억년 전 중생대의 백악기 때 나타나 꽃이 진화하는 초기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오래된 꽃식물 중 하나로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리기도 한다. 꽃눈이 붓 모양을 닮아 목필(木筆), 개화시기 꽃봉오리가 필 때 북쪽을 향한다고 해서 북향화(北向花)라고도 불린다. 꽃말은 고귀함, 순결, 숭고한 사랑이다.
매화나 벚꽃도 목련처럼 이파리보다 꽃이 먼저 핀다. ‘선화후엽(先花後葉)’이다. 이들 꽃은 이른 봄 일교차가 크고 꽃샘추위나 봄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아 금방 시들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목련은 꽃말과는 달리 ‘첫사랑의 덧없음’, ‘봄날의 짧은 기억’, ‘이별의 순간’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많은 시인들의 시적 소재가 되어 왔다.
정지용이 1939년 창간된 문학지 <문장>에서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목월’이라 칭했던 청록파 시인 박목월(1915-1978)은 전쟁 직후에 ‘목련꽃 그늘아래’로 시작하는 사월의 노래를 발표한다.
시에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를 연상케 하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는 청춘의 열정과 슬픔 그리고 ‘구름 꽃 피는 언덕’, ‘빛나는 꿈의 계절’, ‘무지개 계절’은 모두 봄의 생명력과 찬란함, 그리고 이루지 못한 이상과 그리움을 암시한다. 여기에 최초의 여성작곡가로 불리는 김순애(1920-2007)가 곡을 붙인다.
어느새 이 노래는 한국 가곡중에서 대표적인 봄노래로 자리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노래가 발표된 1953년은 전쟁의 폐허와 절망의 시절이었다. 하지만 시인은 새봄이면 언제나 다시 꽃으로 피어나는 크고 화려한 목련을 보고, 찬란한 봄 예찬을 넘어 강건하게 되살아날 우리의 삶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김현수의 가사에 곡을 붙여 1983년 발표한 가객 송창식의 <목련>도 절창이다. 김현수는 송창식 ‘토함산’의 가사도 썼다. 대중음악을 평론하는 강헌은 “송창식은 목련이라는 간결한 소묘의 세계에 트로트를 끌어 들여 ‘천의무봉’의 솜씨로 녹여냈다”고 이 노래를 평한다.
꽃잎이 큰만큼 가지에서 뚝뚝 떨어져 여기저기 흩날릴 때는 처연하기까지 하다. 화려한 꽃만큼이나 제몸에서 떨어지려 작정한 듯한 목련의 거침없는 낙화는 찬란한 봄날의 가장 슬픈 사건이다.
송창식은 목련이 꽃잎으로 떨어질 때는 허공중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 말고, ‘떨어져 연못 위에서 그림자로 새롭게 나타나 하얀꽃으로 떠오는 연못의 물’을 바라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물에 떠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주문한다.
가까운 목련꽃을 다시 찾는다. 꽃은 말이 없고, 봄은 조용히 그러나 은근한 끈기로 어느새 성큼 다가온다. 흰 목련꽃 그늘 아래에서 괴테의 시를 읽으며 하늘거리는 4월의 봄을 맞는다. 목련이 진 자리에는 성가신 봄비의 흔적과 살랑살랑 산란한 봄바람만이 남았다. 젊은 날 우리들의 아련한 추억과 사랑도 그렇게 스며들고 잦아질 터, 내일을 샘봉산 자락 월리사 목련을 만나러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