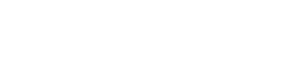동양 5천 년 지혜의 보고인 유교의 가르침 중에 “君子(군자) 愼其獨也(신기독야)”란 구절이 있다. 이 세상의 리더 역할을 하는 군자라면 홀로 있을 때 더욱더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의 가르침이다. 신기독야(는愼其獨也)는 줄여서 신독(愼獨)이라고도 하며 중용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유교의 핵심 가르침인 신독과 관련,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道也者(도야자) 不可須臾離也(불가수유리야) 可離(가리) 非道也(비도야) 是故(시고) 君子(군자) 戒愼乎其所不睹(계신호기소부도) 恐懼乎其所不聞(공구호기소불문)” 즉, 도라는 것은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것이며 떠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고 직역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구절 중에서도, 유교 수행의 핵심 중 핵심은 바로 “戒愼乎其所不睹(계신호기소부도) 恐懼乎其所不聞(공구호기소불문)” 즉, 누군가 타인이 자신의 행동거지를 보거나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을 때조차 즉, 군자는 홀로 있을 때조차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의 언행을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대별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굳이 보고 듣는 누군가와 연결해 해석할 까닭은 없다. 특히 생각이 바르면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말과 그릇된 행동으로 드러나기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생각-감정이 말과 행동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戒愼乎其所不睹(계신호기소부도) 恐懼乎其所不聞(공구호기소불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머릿속의 생각 감정을 삼가고 경계하며 두려워함으로써, 올바른 언행을 하라는 가르침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교의 궁극인 지혜로운 군자가 되기 위한 핵심 수행법인 愼獨(신독)을 누군가 보고 듣지 않을 때조차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하는 수행 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머릿속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생각 및 감정을 미리미리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해석이 될 듯하다. 깨달음을 궁극으로 하는 불교의 핵심 수행법인 관법(觀法) 수행 또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생각 및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겨, 오랜 기억 뭉치인 업식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음으로써, 아상과 아만으로 가득 찬 업식을 녹이고 나 없음의 무아를 깨닫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점에서, 신독 수행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제 안의 온갖 주견을 비워내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그 근본에 있어선 신독 및 관법 수행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온갖 기억 뭉치인 업식의 노예로 전락한 줄도 모르는 채, 업식의 잣대에 기대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점점 업식이 강해지면서, 어둡고 비좁은 자신만의 우물 속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이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방비하며, 나 없음의 무아를 깨닫는 지름길이 바로 군자가 되기 위한 유교의 핵심 수행법인 신독임을 알 수 있다. 신독 수행을 통해 어리석고 낡은 생각에 끌려가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끝내 사라지면, 그 어떤 정형화된 그릇인 업식의 '나'가 없는, 군자불기(君子不器)의 경지에서 노닐게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이렇고 저렇다며 자신을 고집하는 일 없이 물처럼 흘러가는 군자, 나 없음의 무아를 깨달은 보살, 제 생각이 아닌 하늘 뜻에 따라 성령의 도구로 쓰이는 심령 가난한 자들로 넘쳐나는 지상 낙원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