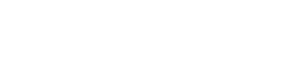강대헌의 행복칸타타

“살아있는 시체를 말한다. 서인도 제도 원주민의 미신과 부두교의 제사장들이 마약을 투여해 되살려낸 시체에서 유래한 단어라 한다. 영화에서는 1932년 벨라 루고시(Bela Lugosi)의 〈화이트좀비(White Zombie)〉가 좀비를 다룬 첫 작품이며….”
좀비라는 말에 대한 인터넷 검색 자료 중 하나입니다. 올해 들어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를 본 게 두 편입니다. 지난 3월에 본 영화 〈웜 바디스(Warm Bodies, 2012)〉는 이랬습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세 가지, 즉 ‘심장이 뛰고 있는 인간’과 ‘심장이 멈춰 있는 좀비(시체)’와 ‘심장이 죽어버린 보니(뼈다귀)’로 나누었다.
2. 인간은 좀비와 보니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높고 두꺼운 장벽을 설치했다.
3. 우리 영화 〈늑대소년(2012)〉과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 기다림과 소통이여!
4. 두려움에서 위대함이 나온다. 그러니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부딪쳐서 뚫고 나가라!
5. 인류가 발굴(excavation)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존재들을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곧 발굴이 아닌가!
6. ‘저스트 아르(Just R)’란 이름의 좀비는 아날로그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로맨티스트(romantist)이면서, 인간과의 장벽을 해체시킨 혁명가이기도 하다.
7. 영화 자체가 대단한 유머요, 미적인 심벌(symbol) 같았다.
지난달에 본 영화 〈월드워Z(World War Z, 2013)〉는 또 이랬습니다.
1. 인류의 대재앙을 예고하는 접근법이 새롭다. 다른 행성과의 충돌도 아니고, 막강한 외계인의 침략도 아니고, 핵전쟁으로 인한 자멸도 아니고, 지진이나 쓰나미나 한파나 벌과 새들의 공격 같은 자연의 교란도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와의 충돌을 다룬 것이다.
2. 좀비라는 존재의 특성을 잘 알고, 또한 사회학적 의미를 살펴봐야만 한다. 좀비는 좀비를 공격하지 않는다.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된다. 좀비도 병든 숙주(宿主)는 건드리지 않는다. 좀비의 얼굴은 아주 거시기하다. 그리고 좀비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3. 이미 좀비 같은 사람들이 사회의 그룹이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화두라고 보고 싶다. 답변을 시작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곤란해진다.
4. 영화는 더 이상의 세계적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제트(Z)’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5. 이스라엘의 ‘열 번째 사람’ 이야기는 즐거웠다. 나머지 아홉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어떻게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하는 열 번째 사람이 없는 사회는 파멸로 가는 길이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6. 주인공 제리 레인(브래드 피트 분)은 냉철하고 희생적인 리더였다.
7. 영화가 국제연합(UN)의 홍보대사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아, 조금 미스터리(mystery)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지인은 제게 좀비 영화가 왜 항상 재밌는지를 밝혀달라고 하셨어요. 좀비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지금 좀비가 돼 가거나 좀비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점이 생겨서일지도 모르겠군요.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