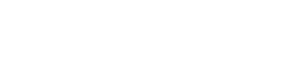데스크의 주장

지난 18일 열린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의 근대문화유산 관련 학술회에서 영동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등록문화재 59호)가 주목을 받았다. 이 다리는 한국전쟁 때 미군 비행기의 기총 사격 및 지상군 사격에 많은 양민이 피살된 비극의 현장이다.
학술회에선 2010년 쌍굴다리에 생긴 총탄 흔적(탄흔)을 복원하면서 탄흔 주위로 페인트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무리 눈에 띄게 하려는 목적이라도 페인트칠한 것은 유적에 손상을 입힌 것”이라고 한 문화재보존과학자가 지적했다. 이에 복원공사 관계자는 “근대문화재의 경우 보존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여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근리 탄흔은 복원방법 논란에 앞서 탄흔 자체에 대한 조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노근리 쌍굴다리의 경우 10m가 넘는 높이로 벽체 위쪽의 탄흔은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방문객들이 많은 총탄 흔적을 확인하는데 흰색 페인트가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다.
탄흔 복원 공사는 10여 년 전 다리 보강공사로 흔적을 잃은 역사적 증거물을 되찾는 작업이었다. 1999년 철도청(현재 코레일)은 다리 누수와 벽체 부식을 막는다는 이유로 다리 내부에 암석용 수지를 바르고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덮어 씌웠다. 그 직후 ‘노근리 사건’이 AP통신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역사를 말살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 학술회에선 탄흔 복원공사의 숨은 이야기가 소개돼 시선을 끌었다. 쌍굴다리의 내벽에선 총 122개의 ‘손상’흔적이 발견됐다. 이 흔적 위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일일이 작은 끌로 떼어내는 작업을 수개월 동안 했다고 한다.
그다음, 이 손상 흔적이 다른 외부 충격이 아니라 총격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했다. 살인 현장을 감식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원됐다. 탄흔 감정을 맡아 60년 전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이 흔적이 1999년 보강공사 이전에 생성된 것임을 우선 밝혀야 했다. 탄흔 함몰상태 및 벽체와 탄흔 면의 색상 비교가 이뤄졌다. 시멘트 모르타르 제거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 아닌지도 세밀하게 살폈다. 굴다리 입구 및 출구 날개 옹벽의 기존 탄흔과 형태 및 유사성이 검토됐다.
결국, 122개의 다리 내부 손상 흔적 중 107개가 탄흔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남았다. 쌍굴다리 중 좌측 굴다리 우측 벽체에 생성된 손상 흔적의 탄도(탄환의 이동로)가 입구 좌측 옹벽에 생성된 탄흔과 일치하지 않았다. 두 탄흔이 다른 사격자에 의해 생겼음을 알려준다. 복원공사 관계자는 노근리 사건 당시 탄흔과 이후 다른 교전에 의한 탄흔의 혼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근리 사건은 개전 초기인 7월 26~29일 일어났다. 후퇴 중인 미군이 현지 주민을 피난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미군들은 피난민에 섞여 침투하는 적 게릴라 색출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먼저 비행기 기총 소사로 철로 위 피난민이 다수 사망했고, 이후 다리 밑으로 피신한 피난민에 대해 미군의 기관총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근리 탄흔 중에는 탄환이 아직 박혀있는 것(흰색 페인트로 세모 표시)도 다수 있다.
역사의 진실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탄도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탄환도 뽑아내 살펴야 한다. 그래서 비행기와 지상사격에 의한 탄흔 여부가 식별되고, 기관총 사격 위치도 찾아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